무등(無等)에 가기 위하여
- 기형도
이제 광주로 간다. 방금 전 강선생과 헤어졌다. 땡볕이 내려쪼이는 전주터미널. ‘내가 내 생(生)에 얼마나 불성실했던가, 생을 방기했고 그 방기를 즐겼던가를 서고사 일박을 통해 깨달았다’고 터미널 층계를 내려오면서 강선생에게 고백하였다.
노트를 펼치다가 놀랐다. 표지에 HOPE라고 쓰여 있었다. 내 여행이 ‘지칠 때까지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였다면 이 노트 또한 내 의지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앉아서 성자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에게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 육체에 물을 묻히고 녹이 슬기를 기다렸다. 서울에서의 나의 행복론은 산산조각나고 있다. 내가 거듭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거듭 변하기 위해 나는 지금의 나를 없애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새벽 4시 상좌승의 예불소리에 잠을 깼다. 2시 가까이 잠들었으므로 몹시 머리가 아팠고 한없이 슬프고 무서운 예불소리에 섞여 아침 9시까지 잤다. 서고사의 아침 9시는 벌써 오전 일과가 한창이었다. 보살님과 의성스님은 법의(法衣)를 삶고 있었고, 숭실대 청년 한진군과 선혜법우는 감잎차 썰기, 마당쓸기에 한창이었다. 세수를 하고 강선생을 깨워 무소르그스키의 곡(曲)을 팝아트로 편곡한 「전람회의 그림」을 들었다. 아침은 거르고 11시에 전주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신라당’이라는 전주 시내 빵집 종업원이었다는 상좌승 얘기를 듣고 ‘사연이 곧 번뇌’라 생각했다. 의성스님과 강선생 그리고 피아노치러 학교 갔던 하욱과 나 이렇게 셋이 국일관에서 백반을 먹었다. 역시 전주의 반찬은 엄청나게 많았다. 식사 후 국일관 옆 카페 ‘빈센트 반 고흐’에 들렀다. 스님의 단골다방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어두웠는데 천정에는 수십개의 사기컵들이 매달려 있다. 밖으로 나와 문방구에 들러 색연필, 노트 등을 사서 하욱에게 주었다. 그녀는 이제 열 살 국민학교 4학년인데 콩나물을 미칠 듯이 좋아했다. 세 자매중 막내인데 부모가 셋 모두를 버리고 이혼했으며 세 자매 모두 갈갈이 찢어졌다. 하욱은 그러나 구김살이 없다. 가끔 일기장에 ‘엄마가 왜 날 버렸을까요?’라 쓴다.
말 그대로 광활한 곡창지대다. 버스는 적당히 흔들리고 있다. ‘밭 가운데 숲’들이 있고 망초들이 흐드러졌다. 산들은 얕고 공손하다. 서고사의 옆 언덕에서는 언제나 해지는 것만 볼 수 있다. 서고사의 하늘은 서역(西域)이고 그 길은 인도(印度)로 뻗어있다. 서고사에는 해가 뜨지 않는다. 그곳에 서면 한없이 위축되고 겸허해지는,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속세를 향해 우쭐할 수 있는, 검고 넉넉한 바위들, 의성스님이 법의를 삶기 위해 군불을 때면 하욱은 그네를 탔다. 의성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 미술을 공부했다고 한다. 힘차게 뻗은 콧날과 눈빛, 입술의 그윽함과 섬세함이 얼핏 잘 생긴 남성을 연상케 하는 의성스님은 불교에서 도(度)는 이치를, 도(道)는 길을 의미한다고 말해준다. 노장(老莊)에서의 도(道)가 불가에서는 도(度)라는 것이다. 서고사의 빽빽한 나무들은 별빛이 가득한 한밤중에 딱딱하게 굳은 먹물처럼 보였다.
필름 한 통을 쓰고 이제 광주로 간다.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곳은 십자가로 만든 땅인가, 넋들 위에 솟아난 도시인가. 나는 아무런 감정도 예감도 없이 무등(無等)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 짧은 여행의 기록 3-1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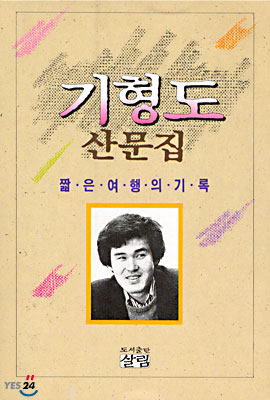
'詩 詩 詩.....♡ > 백 석 & 형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질투는 나의 힘 - 기형도 (0) | 2014.10.24 |
|---|---|
| 10월 - 기형도 (0) | 2014.10.24 |
| 어느 푸른 저녁 - 기형도 (0) | 2014.10.19 |
| 수라 - 백석 (0) | 2014.10.14 |
| 고향 - 백석 (0) | 2014.09.12 |